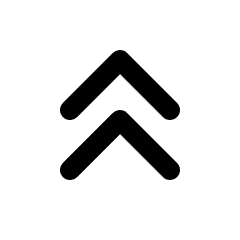지난 1분기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가 3년 반 만에 국내총생산(GDP)을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막대한 유동성에 자산시장이 들썩이면서 가계 빚이 폭증한 바 있는데, 2021년 이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다소 규모가 줄었다. 다만 국제 비교에서 가계부채 비율은 조사 대상(34개국) 가운데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9일 국제금융협회(IIF)가 공개한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를 보면, 올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잔액의 비율은 98.9%로 나타났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3분기 100.5%를 기록해 국가경제 규모를 넘어선 뒤 2022년 1분기 105.5%로 정점을 기록했다가 3년 반 만에 90%대로 낮아졌다. 2021년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가계부채 거품이 다소 꺼진 모양새다. 가계부채 비율 100%는 통화·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목표에서 1차 저지선으로 여겨진다. 국제금융협회는 가계부채 국제비교 자료를 산출할 때 매년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상 개인부채 자료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번 1분기 수치는 한은 자료(현재 집계중)는 아니고 이 협회가 국내 은행들의 관련 데이터를 가져와 추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지난 1분기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조사 대상인 세계 34개국(유로지역은 단일 통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홍콩(92.5%), 태국(91.8%), 영국(78.1%), 미국(71.8%), 중국(63.7%), 일본(63%) 등이 뒤를 이었다. 부채감소(디레버리징)의 1차 목표는 달성했지만, 여전히 주요국에 비해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큰 셈이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경제 성장이나 금융안정을 제약할 수 있는 만큼 현재 100% 이상인 비율이 점진적으로 80%까지 도달하는 게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금리 기조를 얼마나 더 유지할지 세심한 정책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안정적인 총량 관리와 별개로 가계부채의 질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점 역시 통화·금융당국의 숙제다.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진 서민·자영업자 등의 연체율 급등세가 심상찮은 모습이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총액은 지난 1분기 기준 1조3560억원으로 1년 전(9870억원)보다 37.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전’이 필요할 때 자주 쓰이는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카드사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1.63%로 전년(1.21%)보다 0.42%포인트 뛰었고, 같은 기간 저축은행 연체율도 3.41%에서 6.55%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햇살론15’ 등 한계차주를 위한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대위변제율)도 지난해 20%대를 웃도는 등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윤수 서강대 교수(경제학)는 “총량 관리 관점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함께, 한계차주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세심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