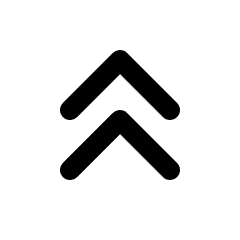일본 오사카의 한인 밀집 지역 츠루하시에서 나고 자란 재일교포 2세 김성웅 감독(61)은 김치를 못 먹는 소년이었다. 하지만 가장 친한 친구 앞에서도 이를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그가 자라던 1970~80년대 재일교포들의 민족의식은 대단했고 한국 민요나 전통춤을 좋아하고 한국 음식을 먹는 게 교포의 기본 덕목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교포들의 강한 유대감에 “위화감을 느끼며 어울리지 못했던” 김 감독이 재일교포 1세 할머니들의 현재를 담은 다큐멘터리 ‘아리랑 랩소디’를 들고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를 찾았다. ‘아리랑 랩소디’는 20년 전 내놨던 ‘꽃할매’의 후속작이다.
“고 오덕수 감독의 조감독으로 다큐멘터리 ‘전후 재일 50년사(1997)’에 참여하면서 재일 한국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다만 꼭 식민지 역사부터 시작해 지금의 차별에 도착하는 흐름만이 정답일까, 다른 접근은 해볼 수 없을까 생각하게 됐죠.”
그런 고민을 할 때 만난 게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 사는 재일교포 1세 할머니들이었고 그 결실이 연출 데뷔작 ‘꽃할매’(2004)였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세월을 살아온 분들인데도 너무나 건강하고 늠름한 모습”에 감명 받은 그는 제작을 결심하면서 “힘든 과거의 이야기는 절대로 묻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대신 “꿈이 뭐냐”고 물었다. “지금 먹고 웃고 하는 게 꿈이야”라는 할머니들의 맑은 답변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살아온 가혹한 세월을 눌러 담아 드러냈다.

애초 김 감독이 후속작 ‘아리랑 랩소디’를 계획했던 건 아니다. ‘꽃할매’ 이후 기록 차원에서 팔순 넘어 글을 배우고, 오키나와·히로시마 등으로 여행 가 비슷한 세월을 겪은 할머니들과 교류하는 일상을 이따금 촬영하다가 2015년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안보 법제화 이슈가 나오면서 그의 카메라는 바빠지기 시작했다. “재일한국인을 향한 헤이트 스피치 집회가 할머니들 사는 동네에서 열렸어요. 극우 집회가 열려도 공격받는 당사자의 주거지 바로 앞에서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할머니들 얼굴이 한분 한분 떠올리며 나도 이제는 도리없이 이 문제를 마주해야겠구나 마음먹게 됐죠.”
공포에 질렸을 할머니들을 걱정하며 달려갔더니 이들은 그가 처음 봤을 때보다 더 씩씩했다. 도리어 일본 국회 앞에 가서 안보 법제화 반대 시위를 하겠다고 했다. 많은 이들이 거동이 불편한 탓에 도쿄까지 갈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사는 사쿠라모토 지역에서 800m를 행진하며 할머니들은 “전쟁 반대” “아이들을 지켜라”를 크게 외쳤다. 김 감독은 이 현장을 보면서 “뜨거운 한류 붐 기세로 높아지는 한국에 대한 관심 속에서 도려내듯 빠져버린 재일교포의 역사를 담아야겠다”는 결심하고 ‘아리랑 랩소디’를 완성하게 됐다.
김성웅 감독은 할머니들을 만나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존엄과 품위를 잃지 않는 인간의 위대함을 알게 됐고 이 주제는 그의 중요한 연출적 방향이 됐다. 1967년 강도 살인죄로 무기징역 판결을 받고 29년을 옥살이한 뒤에야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옥중에서도 노래를 부르고 시를 쓰며 “불운하지만 불행하지 않았다”고 회고하는 주인공을 따라가는 ‘사쿠라이 쇼지의 어떤 기념일’은 2022년 일본 고엔지 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다.
내년 전후 80주년을 기념해 김 감독은 악성 댓글과 협박에 시달리면서도 혐오 발언과 맞서는 재일교포 3세들을 다루는 작품을 구상 중이다. 젊은이들이 “혐오 발언과 악성 댓글의 공격이 집중되는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또 “한국에서 나고 자라 일본으로 떠나온 내 부모와 일본에서 나고 자라 멕시코에 이민 간 내 딸, 그리고 멕시코에서 태어난 두 손주로 이어지는 디아스포라의 여정을 그리는 작품도 만들고 싶다”고 했다.
김은형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