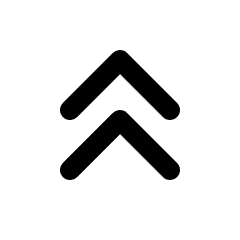평안도 맹산 땅에서 대자연을 벗하면서 화가를 꿈꾸던 소년이 있었다. 해방 뒤 분단은 그를 고뇌에 빠뜨렸다. 중학생이던 16살 때 봇짐을 이고 38선을 넘어 월남했다. 거장 화가 이쾌대의 지도를 받고 미술대학에 갓 입학한 21살 때 한국전쟁이 터졌다. 동창생과 이웃들이 주검으로 삭아서 사라지는 것을 목도하면서 제주 섬으로 갔다. 거기서 1년 남짓 경찰관이 되어 순찰을 도는 틈틈이 그림을 그렸다. 청년 작가 김창열은 속으로 자신이 본 모든 참상을 그림으로 씻어내리고 싶다고 수도 없이 되뇌었다. 1970년대 초중반 저 유명한 물방울 그림을 내놓으며 한국 화단의 스타작가로 국민적 인기를 누리게 된 그는 말년이 되어 둘째 아들 김오안씨가 찍은 다큐멘터리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2015~2019년 제작)에서 술회했다.
‘난 많은 죽음과 끔찍한 잔인함을 봤다. 내가 처음에 물방울을 택한 이유는 어쩌면 인간의 기억을 온전히 초토화하며 모든 고통, 이 견딜 수 없는 것들을 없애기 위함이었을 것이다…내 물방울은 아기의 소변이다. 또한 스님들이 사찰마당에 부은 정화수이기도 하다.’
지금 ‘영롱함을 넘어서’라는 제목을 달고 서울 사간동 갤러리현대 전관에 내걸린 작고 대가 김창열(1929~2021)의 물방울 그림 38점은 모두 이런 작가의 유년기와 청년기의 시각적 체험을 원형질로 깔고 있다. 실밥이 보이는 맨 화폭에 연기처럼 허연 궤적을 남기며 한줄기가 흘러내린 말년의 물방울과 한자나 알파벳 글자로 된 서책 위에 일정한 방향을 좇으며 맺힌 날선 물방울, 한자 자체나 거뭇한 화폭 위에 스며들거나 곤죽이 되어버린 듯한 물방울, 오롯이 직립한 듯 둥그런 모양새를 곧추세운 물방울 등이 모두 그런 기억의 고통을 머금고서 작가의 손끝에서 삐져나왔다.

1971년 프랑스 파리 마구간 작업실에서 재활용하려는 마대에 맺혀 청아하게 햇빛을 받은 물방울에서 착상하고 그 이듬해인 1972년 현지 전시에서 첫 선을 보였으며, 2020년 갤러리 현대의 마지막 생전 개인전 ‘더 패스(The Path)’까지 내보였던 필생의 화두 물방울들이 어떻게 변천해왔는지를 생생한 작가의 말년 다큐 동영상과 함께 훑어내리게 되는 감상의 자리다. 1970~90년대 국내 화가의 그림 도상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미지가 된 탓에 서울 삼각지 이발소 그림 업체들에서 키치 작품까지 양산되었던 물방울의 조형적 의미와 그 안에 들어있는 작가의 개인사, 현상학으로까지 풀이할 수 있는 시선의 깊이까지 음미할 것을 권한다. 6월9일까지.
글 ·사진 노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