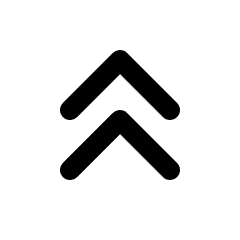[짬] 바오밥나무 육묘일지 ‘안녕 바오’ 펴낸 박남준 시인

“아무래도 생텍쥐페리를 고발해야겠다. 바오밥 나무를 무고한 죄….”
박남준(67) 시인이 새로 낸 책 ‘안녕 바오’(기역)는 이렇게 느닷없는 고발의 말로 시작한다. 생텍쥐페리를 고발하다니! 더구나 그 자신 ‘어린 왕자로부터 새드 무비’라는 시집을 냈고 그 시집으로 문학상도 둘씩이나 탄 시인이 무슨 억하심정으로?
배흘림기둥 닮은 사진 보고 빠져
고사하던 강연까지 하며 경비 모아
지난해 7월 마다가스카르로 여행
“2주간 나무만 봤는데 질리지 않아”
현지서 선물 받은 씨앗 심어 키워
“주변 식물·사람들과 햇빛·물 나눠
‘어린 왕자’ 나쁜 인식 바로잡고파”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는 바오밥 나무가 나쁜 이미지로 나옵니다. 어린 왕자의 별에 무서운 씨앗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고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면서 어린 왕자의 별에 구멍을 뚫어서 별이 산산조각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왕자는 바오밥 나무를 규칙적으로 뽑아 줘야 사랑하는 장미를 지킬 수 있다며, ‘어린이들이여! 바오밥 나무를 조심하라’고 말하기까지 하죠. 바오밥 나무에 관한 그런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썼어요.”

8일 전화로 만난 박남준 시인은 이렇게 설명했다. 바오밥 나무와 시인의 인연을 얘기하자면 2019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가 사는 경남 하동 지리산 자락 집 마당에 왕마사토를 깐 것이 그 무렵이었다. 대책 없이 올라오는 풀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왕마사토를 깔게 되었는데, 그 위를 걸을 때 나는 소리가 ‘사각사각’, ‘사락사락’ 하더니 어느 순간 ‘사막사막’으로 들리더라는 것. 사막은 이내 불시착한 비행사와 어린 왕자로 생각을 이끌었고, 인터넷에서 어린 왕자와 관련한 검색을 하다가 바오밥 나무 이미지를 만나게 되었다.
“책에서 어린 왕자의 별을 괴롭히는 괴물 같은 존재로 나왔던 바오밥 나무를 사진으로 보니까, 이건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을 닮았는가 하면 우주의 별들과 교신하는 커다란 안테나 같기도 한 이상하고 신비한 모습이라서, 도대체 이런 나무가 지구에 존재한다는 게 정말인가 싶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생텍쥐페리가 보았을 바오밥 나무는 잘 알려진 마다가스카르의 바오밥 나무가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세네갈에 있는, 다른 종류의 바오밥 나무였더군요.”

어쨌든, 사진으로 접한 바오밥 나무의 경이로운 존재감은 마다가스카르에 가서 바오밥 나무를 직접 만나고 싶다는 조바심을 낳았다. 집 천장의 얼룩무늬가 사막여우처럼 보이는가 하면, 바오밥 나무가 자신을 들어 올려 목말을 태우는 꿈을 꾸기도 했다. 평소 잘 안 다니던 강연 요청에 꼬박꼬박 응하며 여행 경비를 모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일차 포기했다가, 역병이 어느 정도 누그러진 지난해 7월 마침내 마다가스카르로 향했다. 가기 전에 쓴 시 ‘어린 왕자로부터 새드 무비’를 표제로 삼은 시집으로 임화문학예술상과 조태일문학상을 받는 겹경사도 있었다.
“불시착의 연속에 있었다/ 바오밥 나무들이 점등을 시작하는/ 비상활주로의 길 끝에 사막은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그리움이 사막을 메아리쳤다”(‘어린 왕자로부터 새드 무비’ 도입부)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온전히 바오밥 나무들만 보기 위한 2주간의 여행이었다. 아무리 보아도 질리지 않았다. 여느 여행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다른 여행에서는 대체로 이국적인 풍경이나 풍물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행은 처음으로 ‘생명’을 만나는 기분이 들더라구요. 몸통이 그렇게 큰데도 가지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짧아서 주변에 사는 다른 식물들과 햇빛을 나누는가 하면, 몸통에 물을 저장했다가 가물 때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하는 게 바오밥 나무거든요. 생텍쥐페리가 그린 파괴자 바오밥과는 전혀 다른 거죠.”

마다가스카르에서 돌아올 때 그의 짐 가방에는 바오밥 나무 씨앗이 가득 든 페트병이 담겨 있었다. 호텔 주인인 프랑스 할아버지가 선물로 준 이 씨앗을 그는 화분에 심고 물을 주며 키웠다. 열대 식물이라 시행착오를 겪고 몇몇은 얼어죽기도 했지만 방 안에서 키운 댓 그루는 살아남았다. 그렇게 씨앗이 어린 나무로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며 쓴 게 이 책 ‘안녕 바오’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오’는 푸바오가 아니라 바오밥 나무의 바오라는 사실.
“어린 바오밥 나무에게 ‘바오’라는 이름을 붙여 주고 육아일지 아닌 육묘일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잎을 하나씩 들춰서 벌레를 잡아 주는 게 일과가 됐죠. 제가 결혼이나 육아 경험은 없지만, 아이가 배냇짓을 시작할 때 영혼이 다 녹아 버리는 것 같다는 말이 이해가 되더군요. 그동안 다른 생물들을 많이 키워 봤어도 이런 느낌은 처음입니다. 한 뼘 한 뼘 자라는 바오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는 기분으로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있어요.”

흰동백나무, 가시연꽃, 비파나무, 치자나무, 해당화, 산수유, 수국, 깽깽이풀, 눈새기꽃, 산작약, 상사화, 백양꽃, 위도상사화, 모란, 범부채…. ‘안녕 바오’ 앞부분에는 시인의 집 마당에서 자라는 다른 식물들이, 바오를 향한 그의 편애에 불평 불만을 터뜨리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 전주 모악산 자락에 살 때에 집 앞 개울 버들치들에게 밥풀을 먹이며 돌본 일도 있지만, 바오밥 나무를 키우는 건 버들치와는 또 다른 경험이네요. 버들치는 스스로 움직이니까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이는데, 얘(=바오밥 나무)는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내가 돌보지 않아도 스스로 자라겠다 싶을 때까지는 부모처럼 챙겨 줄 생각입니다.”
최재봉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