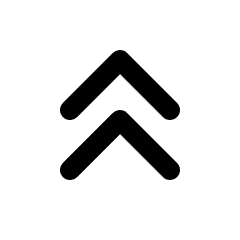최근 3부작으로 방송된 다큐멘터리 ‘학전 그리고 뒷것 김민기’(SBS)의 울림이 크다.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했을 뿐 아니라, 페이스북 등 에스엔에스(SNS)에서 연일 감상평이 쏟아진다. 특히 어린이날인 지난 5일 방송된 3부를 보고 크게 감명받았다는 고백이 잇따른다.
3부는 김민기의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집중 조명했다. 그는 어려운 형편으로 중학교도 못 가고 일터로 내몰린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야간학교를 열었다. 달동네 아이들을 위한 유아원 건립을 돕는 공연에도 기꺼이 참여했다. 무엇보다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대학로 소극장 학전이 뮤지컬 ‘지하철 1호선’으로 대박을 쳤을 때 돌연 이를 중단하고 어린이극에 힘을 쏟았다.
그는 예술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었다. 하지만 돈은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는 예술로써 세상에 꿈과 희망을 심으려 했다. 노래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북돋고(‘아침 이슬’), 합동 결혼식을 하는 공장 노동자들을 축복하고(‘상록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못해 낙담한 선수들을 위로했다(‘봉우리’). 음반으로 번 돈을 쏟아부어 학전을 만든 것도 작고 가난한 예술가들의 못자리가 되고자 해서다.

그는 2008년 한창 잘나가던 ‘지하철 1호선’을 멈추고 어린이극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 “돈 되는 일만 하다 보면 돈 안 되는 일을 못할 것 같아서”라고 했다. 어린이극은 돈이 안 된다. 그래도 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기는 일은 예술의 존재 이유와 상통한다. 예술은 돈을 벌라고 생겨난 것이 아니다. 꿈, 즐거움, 위로 등에 대한 갈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노래도 그랬다. 노동의 고단함을 잊고자, 상실로 슬퍼하는 이를 위로하고자,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자 흥얼대던 것이 음악이 됐고, 예술이 됐다. 현대 대중음악도 다르지 않다. 가수가 스스로 좋아서 부른 노래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줬다. 돈이 따라온 건 그다음이다. 케이(K)팝도 시작은 10대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였다고 믿고 싶다.
언젠가부터 케이팝은 예술보다 산업이 됐다. 음반이 얼마나 팔리고 매출이 얼마나 발생하는지가 성공의 잣대가 돼버렸다. 자본이 몰리고 규모가 커지면서 누가 더 좋은 음악을 만드느냐보다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느냐의 싸움으로 전락했다. 대형 기획사들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이런 흐름은 더욱 가속화했다. 주가를 올리고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해 기획사들은 성장을 멈출 수 없다. 멀티 레이블 체제를 공장처럼 돌려 속도전으로 신곡을 내고, 신인을 만들고, 올림픽 메달 경쟁하듯 숫자에 매달린다.

필수적으로 그림자도 짙어진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폭로한 음반 밀어내기, 랜덤 포토카드, 팬사인회 응모권 등이 대표적이다. 구식 매체로 밀려나 듣지도 않을 실물 음반을 최대한 많이 팔려는 꼼수들이다. 케이팝은 이제 아이들 꿈을 볼모 삼아 주주들 배를 불리는 장사판이 됐다.
이번 하이브와 민 대표 갈등 사태에서 아이들은 어떤 취급을 받고 있나? 뉴진스, 아일릿 등 10대 아티스트와 그들을 좋아하는 10대 팬들이 받을 상처를 헤아려보긴 했을까? 그들이 돈과 자존심을 걸고 벌이는 싸움의 진짜 피해자는 누구인가? 이런 식의 케이팝 산업에 언제까지 박수를 보낼 수 있을까? 재정난을 못 버틴 학전은 문을 닫았고, 물음표는 쌓여만 간다.
서정민 기자